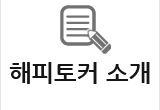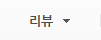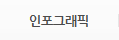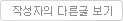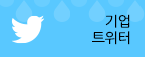*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파리에 들어서니 우중충한 날씨가 반겨주네요. 역시 파리는 흐려야 느낌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미 경험했던 파리이지만, 몇 번의 여행으로 도시의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파리를 더 깊이 보기를 바라며… 여행은 시작됩니다.
파리 첫날은 숙소에 들어가 정리하고, 아기 재우니 8시였어요. 호텔 앞에 맛있는 홍합요리를 먹으러 갔어요. 캐쥬얼 한 식당이지만 참 좋았더랬지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홍합수프. 예전에도 맜있다고 물개박수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 파리 둘째날.
* 파리 둘째날.
생드사펠-노트르담-점심-오랑주리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생드사펠성당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작은 계단으로 한 층 올라간 곳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펼쳐집니다. 사진으론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 느낌이 느껴지나요.

생드사펠을 나서서 노트르담으로 갑니다. 헛…. 노트르담이 인기가 더 많으니 노트르담부터 왔어야 했는데… 입구까지 쭉 늘어선 긴 줄에 아기와 기다릴 수 없어 결국 바깥에서 보기로 해요. “괜찮아 예전에 가보았잖아.” 위로가 되지 않는 말로 아쉬움을 달래보아요. 노트르담 앞 제로뽀앙에 우리 발을 살며시 올려보아요. 여기 발을 올리면 다시 파리에 온다고 합니다.

노트르담 근처에 유명 빵집에서 샌드위치와 에끌레어를 사고, 다시 길을 건너서 세익스피어 컴퍼니에 갑니다. 영화 비포선셋에서 에단호크와 쥴리델피가 다시 만났던 그 곳, 9년전의 사랑을 재회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아기를 안고도 소녀처럼 감성에 빠져 기웃기웃 거립니다.

숙소에서 아기에게 맘마를 먹이고, 오랑주리로 나섭니다. 오랑주리의 모네를 만나러 파리에 왔다 했는데.. 월요일은 휴관인데 왜 미쳐 생각을 못한 걸까요? 참 많이 헤멘 날이에요.
덕분에 세느강 건너 맞은편 오르세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오후이고, 흐린 날씨라 여기도 줄이 길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아기가 있다고 바로 입장하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이런게 프랑스인들의 여유와 똘레랑스일까 싶으면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오르셰+오랑주리 패스를 끊으면 16유로에요. 따로 보는 것 보다 절약도 되고, 4일이내 오르셰는 1회, 오랑주리는 몇 번이고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두 미술관 모두 고흐나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고흐의 가셰박사의 초상, 자화상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벅차 오르는 고흐의 그림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예술혼, 그 벅찬 느낌이 참 좋았어요.
돌아오는 길, 센 강변에 노점들을 뒤적여봅니다. 예전의 파리모습 지도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상투적이거나 올드한 느낌.. 시간을 많이 소비한 채로 너덜너덜하게 돌아옵니다.

방에서 내다만 봐도 운치 있는 이 도시는 이제는 아기엄마가 되어버린 이 현실적인 사람을 낭만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술가들의 집결지가 되어왔는지, 감수성이 무뎌진 이 마음에도 알 것 같지요. 컬러풀하지 않은 집들은 말해줍니다. “여기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시크하노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번도 촌스러웠던 적 없노라.”
*파리 셋째날, 드디어 오랑주리에 갑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였어요. 튈르리 한 모퉁이에 있는 오랑주리의 수련방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기와 그 둥근 방을 연못 돌듯 몇 번이고 돌다가, 수련연작8개중 아침의 수련 그림을 샀어요. 거실에 걸어, 이 날의 행복을 기억하고 싶어서지요. 지하에도 빠지지 않는 대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풍만하고 따뜻하고 밝았던 르누아르의 작품들도 기억에 남아요.

미술관을 나와 튈르리 정원에서 오리도 보고, 일광욕을 하며, 아기는 즐거워합니다.


돌아가는 길 샹젤리제 거리로 갑니다. 개선문까지 쭉 걸었어요. 마카롱도 먹고, 이곳 저곳 구경하고, Aux Champs-Elysee, aux Champs-Elysees, au soleil, sous la pluie, a midi ou a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Elysee ~♬ 예전에 배운 샹송까지 부르며 신이 났지요.
점심을 먹고 에펠탑으로 향합니다. 파리의 상징이자 낭만의 상징이 된 탑,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다지요. 모파상이 에펠탑 식당에서만 식사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요. “파리에서 이 흉물스러운게 보이지 않는 곳은 여기뿐이기 때문”에… 모파상의 마음에 들었거나 말거나, 엄마는 또 설렙니다.

우리의 포토존, 사이요궁에서 또다시 찰칵, 에펠탑 밑에서 올려다보다, 아기와 바토무슈를 타고 또 세느강을 건너며 돌아와요. 에펠탑 근방을 서성이다 폴에 들러 에끌레어와 샌드위치를 한아름 사들고, 맥주와 꽈자도 사들고 방으로 향합니다. 길 것만 같던 낮도 어느새 저녁이 되어가고,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내일 저녁비행기로 집에 귀가 하게 되지요. 아쉬운 마음 그득한 채로 반짝이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저는 언제 또 오게 될까 생각합니다.
* 여행 마지막 날, 날이 또다시 흐립니다. 우산을 부여잡고, 생제르맹지역에 갑니다. 파리지앵들이 기도하러 간다는 생제르맹데프레 교회를 들어갔는데.. 날이 흐려서 그런지 이 오래된 중세의 교회는 좀 신비로우면서도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
교회 바로 앞에는 카페레뒤마고와 까페드플로르가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피카소와 같은 파리철학과 문학, 예술 거장들이 즐겨찾던 곳 이었다는 이 마주앉은 두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 사상에까지는 미쳐 미치지 못한 스스로의 부족이 부끄럽습니다. 자주 비가 오는 쌀쌀한 파리에서, 당대 지식인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카페들은 물질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신자유주의 시대를 빗겨나갈 프랑스의 저력, 철학과 문학의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제르맹근처에 핫하다는 샵들을 기웃기웃하다, 마카롱을 사들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비오는 날씨에 아기는 많이 짜증이 났나 봐요. 미안 아가..


이제 정말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갑니다.
저녁비행기가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아기는 타자마자 자고, 내릴 때가 다되어서 일어났어요.
옆 좌석의 은발의 할머니께서 such a good boy!! 하셨지요. 정말 착한 아기였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이었어요. 삶도 하나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엄마아빠의 인생에 이 아기는 꼭 함께 이겠죠. 여행에서 본 것들, 우리 아기는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기억들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이, 저는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때론 제약도 있고, 힘들기도 했지만, 제약이라고 보지 않고, 아기가 있는 우리의 삶을 당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행할 만 한 것 같아요.
아기도 엄마 아빠의 즐거웠던 감정들을 함께 느꼈을 거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아가가 밝고 따스한 성격을 갖게 되기까지 기대해봅니다. 어쨌든, 잘 버텨준 아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도 하지 못했겠지요. “아가, 고마워. 남은 여행도 잘 해내보자.”